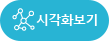| 항목 ID | GC04601874 |
|---|---|
| 이칭/별칭 | 타작질 소리,도깨질 소리,도깨 소리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집필자 | 조영배 |
| 채록 시기/일시 | 1992년 - 조영배 「마당질 소리」 채록 |
|---|---|
| 채록지 | 마당질 소리 - 서귀포시 강정동 외 제주도 전역 |
| 가창권역 | 제주도 전역 |
| 성격 | 민요|노동요 |
| 토리 | 레선법 |
| 출현음 | 레미솔라도 |
| 기능 구분 | 농업노동요 |
| 형식 구분 | 선후모방창, 1마디를 기준선율로 하여 메기고 받음 |
| 박자 구조 | 6/8박자 |
| 가창자/시연자 | 제주도 남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도리깨질을 하면서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던 노동요.
「마당질 소리」는 타작질 소리, 도깨질 소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탈곡기가 따로 없었던 과거에는 콩이나 메밀·보리·팥 등 곡식을 수확한 다음 그것을 도리깨라고 하는 도구로 내리쳐 탈곡했는데, 이 일에 수반되었던 민요가 바로 마당질 소리이다.
이 작업은 주로 마당이나 또는 밭의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마당질 소리’라고 부르고 있다. 도리깨를 내려치는 작업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두세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다. 또한 다른 한 두 사람은 탈곡할 곡식을 조정하는 보조적인 일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작업에 수반되는 소리는 자연히 타작질하는 두 사람 이상이 교대로 가창하며, 나머지 사람들도 후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60년대 이후에 제주대학교 김영돈 교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설 채록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1990년대 이후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조영배 교수를 중심으로 사설 채록은 물론 다양한 악곡 채보가 이루어져 왔다.
「마당질 소리」는 한 사람의 선소리꾼이 본 사설을 엮으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어야 홍아’, ‘어유 하야’ 등의 후렴구를 받는 형태로도 부르고, 한 마디의 간격을 두고 선소리를 뒷소리가 계속하여 모방하는 형태로도 부른다.
음악적으로 보면, a-a' 식으로 선후가 매기고 받거나 모방을 하다가, 도리깨질을 더욱 힘을 내어 해야 할 상황[또는 도리개질이 흥겨워질 경우]에서는 갑자기 가락이 높아지면서 b-b'의 가락이 나오면서 전개된다. 그러다가 다시 a-a'의 가락으로 되돌아오는 식으로 전개된다.
「마당질 소리」는 서귀포 지역에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작업의 강한 박절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율이 비록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리드미칼한 자극이 있는 관계로 상당히 흥겹게 부른다.
사설의 내용은 크게 이 노동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 제주도민들의 삶의 상황에 대한 내용, 여성들이 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시집살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리깨질을 하면서 타작하는 일은 보리나 콩 등 주로 여름 작물을 수확할 때 자주 하였다. 때문에 6월 또는 한여름, 조금 늦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가을 땡볕 아래에서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리깨질 자체가 상당히 힘든 노동이기도 하다.
때문에 「마당질 소리」는 이러한 노동을 이겨내려는 권력(勸力)적인 기능을 상당부분 하는 민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마당질 소리」의 노동 현장성은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이 민요 역시 제주도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노인분들은 이 민요의 가락과 사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음악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박자적인 틀 안에서 가락을 자유롭게 변이하면서 부르는 특징이 있는 민요로서 음악적 의의가 있으며, 사설 또한 제주도민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도서출판 예솔, 1992)
- 조영배, 『남제주군 민요 현장조사 연구』(도서출판 예솔, 1996)
- 조영배, 『제주의 향토민요』(도서출판 예솔, 2000)
- 조영배, 『북제주군 민요 채보 연구』(도서출판 예솔, 2002)
- 조영배, 『서귀포시의 전승 민요』(서귀포시, 2003)